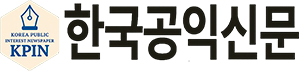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우리 사회는 미담을 좋아한다. 기부와 봉사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행위다. 그러나 순수한 호의가 불편한 기대와 권리로 변질될 때, 그 결과는 씁쓸하다.
공적 영역에서 호의는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이들이 돌아오는 대가가 없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깊다. 선의가 특정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순간, 호의는 권리라는 옷을 입는다. 기대가 꺾였을 때 좌절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일부 권력층은 이러한 정(情)과 관계를 교묘히 이용한다. 연고와 인연을 방패 삼아 공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지인 챙기기’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안일한 인식이 미담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된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사회는 공적 행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열정을 식게 한다. 진정한 선행이 인정받고 공정한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호의는 냉소를 자아내는 원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