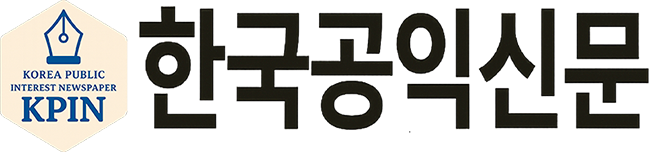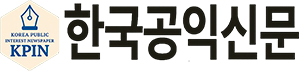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1편에서 다뤘듯, 요즘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문자 폭탄은 유권자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왜 그들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런데 이번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정말 중요한 문제, 바로 ‘돈’이다.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거는 거대한 잔치다. 꽃이든 잔치든 그냥 피고 차려지는 법은 없다. 핀도 사고, 풍선도 불고, 떡 한 조각이라도 올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금도 없이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다. 물론 ‘맨땅에 헤딩’하는 열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는 열정만으로 치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거 캠프를 꾸리고 정책을 알리고 유세차를 돌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는 모두 비용이 든다. 무엇보다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는 해줘야 한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 교통비라도 챙겨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당에 충성했으니 공천받았어! 알아서 도와줘!”라는 식의 출마는 진심 이전에 민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금 없이 당선된 이후다. 선거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갚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정치 자산을 불리기 위해 정치를 이용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후원금이 아닌 사적 거래 공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클린 정치”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잔칫상 비용도 못 낸 후보에게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건 순진한 착각일 수 있다.
여기서 시민의식도 함께 짚어야 한다. “철이 엄마가 OOO 후보 찍자고 하더라”, “우리 동네 누구는 이 당 사람이라더라” 같은 말에 휩쓸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표를 던지는 현실.
우리의 한 표는 내년, 내후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무게를 지닌다. 그런데 그 표가 옆집 아줌마의 추천이나 감정팔이에 흔들린다면 정치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는다.
기업은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며 이익을 계산한다. 그런데 일반 시민은 아무런 기준 없이 덩달아 춤을 춘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투표할 때다. “내가 왜 이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이 후보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후보자는 출마를 결심했다면 최소한 자신의 잔칫상을 차릴 자본력은 갖춰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며 당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 철학의 증거다. 그리고 유권자 역시,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내 손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겨운 악순환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 <다음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