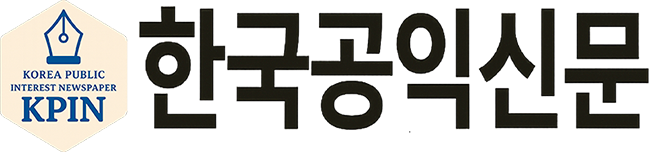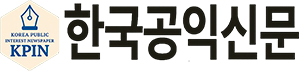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추석 명절은 가족과 전통, 그리고 삶의 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모태신앙’.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종교적 환경 속에서 자란 이들을 일컫는 말로, 흔히 “엄마 뱃속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표현으로 회자되곤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 태아가 외국을 여행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종교 역시 단순히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앙은 결국 개인의 선택과 성찰,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어린 시절 불교적 환경에서 자라 종교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해 교회를 다니며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적 오해와 단절도 경험했다. 명리학이라는 동양 고전학문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일부 종교 지도자가 이를 ‘점집 차리는 일’로 치부했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하지만 명리학은 주역과 역경을 포함한 사서삼경의 일부로, 고대 유학자들이 천문과 지리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던 학문이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모태신앙’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과연 신앙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인가. 모태신앙은 분명 익숙함과 안정감을 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곧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질문과 의심, 그리고 그에 대한 탐색을 통해 비로소 ‘자기화’되는 것이다.
종교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나침반이 진정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잡은 것이어야 한다. 부모의 신앙은 씨앗이 될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각자의 토양과 햇빛, 그리고 물을 주는 노력에 달려 있다.
결국 ‘모태신앙’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가장 초기에 심어진 문화적 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환경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여정은 각자의 선택과 성찰에 달려 있다. 명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