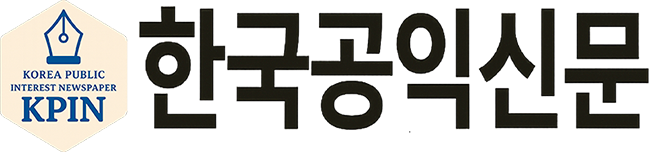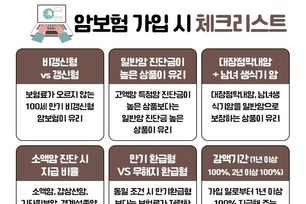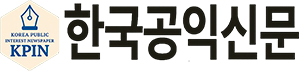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참사는 사회의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다. 그 고리에 국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국민의 신뢰는 극단적으로 요동친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중요하다. 구조의 책임을 넘어서 감정의 회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의 대면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책임의 언어’였다. 많은 국민은 이 발언을 통해 “국가가 다시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목숨을 비용으로 바꾸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정책적 안전 기준 강화로 이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단지 위로가 아닌 ‘구체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런 사례들은 말의 진정성이 가진 치유의 힘을 증명한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있는 그대로의 책임 인식’이며 그걸 직접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전체의 감정 구조를 회복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