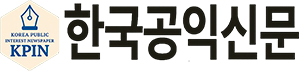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도심의 길을 따라 나 있는 가로수는 단지 녹지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숨결이며 시민의 정서적 쉼터이다.
무더운 여름날 그늘을 드리우고 미세먼지를 걸러내며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의 숨통을 틔우는 살아 있는 존재다. 하지만 그 발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묵의 비극’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대다수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속 가로수 보호판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설치된다. 어린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슬그머니 얼굴을 드러낸다. 보호판이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잘 들어맞던 금속 틀이 어느 순간부터 나무의 줄기를 죄기 시작한다.
줄기는 자유롭게 굵어질 공간이 없고 뿌리는 밀폐된 흙 안에서 숨도 쉬기 어려워진다. 심각한 경우 금속이 나무의 겉껍질을 찢고 내부를 파고들면서 생명줄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이른바 ‘침묵의 살인자’다.
그뿐만이 아니다. 금속 보호판이 밀려 올라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판이 뒤틀리면서 도시 미관까지 망가뜨린다. 시멘트 포장면이 갈라지고 도로가 변형되며 결국 수리를 요하는 구조적 문제로 비화된다.
수십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장치가 되레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시를 병들게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가?
답은 멀지 않다. 자연에서 온 해답 야자매트가 있다. 야자 섬유로 만든 이 매트는 놀라운 유연성과 통기성을 자랑한다.
줄기가 굵어져도 함께 늘어나며 압박 없이 감싸주고 물이 스며들고 공기가 흐르며 뿌리는 답답함 없이 자유롭게 숨을 쉰다.
매트는 땅속 미생물의 활동을 돕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한다. 단지 나무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 쉬며 성장하는 자연의 친구인 셈이다.
게다가 설치비용도 기존 금속 보호판보다 훨씬 저렴하다. 폐기 과정에서도 환경오염 염려가 없어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시민의 세금이 보다 건강한 가로수 생태로 쓰이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쯤 되면 야자매트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도시를 꿈꾸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생명을 억누르지 않는 도시, 뿌리가 자유롭게 숨 쉬는 거리 시민이 안전하게 걷는 일상. 도시의 품격은 인프라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비롯된다.
가로수는 도시의 허파다. 숨 막히는 구조물을 벗고 자연의 품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보호’라는 이름의 억압을 걷어내고 야자매트라는 숨 쉴 권리의 상징을 심어줄 때 우리의 도시도 비로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